La plus vieille auberge de France propose une cuisine mêlant tradition et innovation. Son plat phare ? le canard à la rouennaise !
La Couronne est l'une des institutions de la ville. « Plus vieille auberge de France », elle accueille les gourmands depuis 1345. Sa façade à pans de bois, ses géraniums et ses drapeaux multicolores agrémentent ce lieu qui sort du lot. De nombreuses personnalités, de la princesse Grace de Monaco à Salvador Dali, en passant par Serge Gainsbourg, s’y sont bousculées pour déguster le plat traditionnel le plus réputé : le canard à la rouennaise. En cuisine, Vincent Taillefer élabore à chaque saison une nouvelle carte dans laquelle il mêle la tradition à l'innovation.
Le saviez-vous ? Cet avis a été rédigé par nos auteurs professionnels.
Avis des membres sur LA COURONNE
Les notes et les avis ci-dessous reflètent les opinions subjectives des membres et non l'avis du Petit Futé.
Trouvez des offres de séjours uniques avec nos partenaires
Questions fréquente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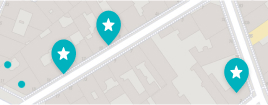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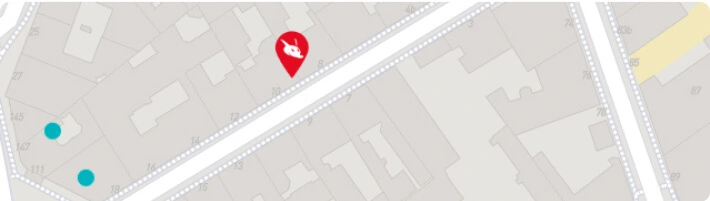









일각에선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프렌치 레스토랑으로도 불리는데 이에 대해선 좀 이견이 있다. 진위를 떠나 분명한 건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 시대 때 역사가 시작됐단 사실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비롯해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다녀간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 중 줄리아 차일드란 분은 미국에 프렌치를 전도한 미국 여성 셰프다.
이 레스토랑에 있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여성인데 그 이유는 그녀가 처음으로 프렌치를 접한 장소가 이곳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녀가 프렌치의 맛에 푹 빠지게 된 곳도 이곳이다.
미국인이 아니다 보니 인상적이게 와닿는 일화는 아니었으나 흥미로움을 줬고 직원분의 안내를 받아 1층에 자리를 잡았다. 위층은 레스토랑으로 안 쓰는 줄 알았는데 쓰고 있었다.
메뉴는 코스도 준비되어 있으나 시그니처인 오리 요리의 경우 단품에 2인분부터 가능해 오리 요리만 주문했다. 가격은 인당 72유로로 꽤 세서 와인은 제일 싼 보르도 레드로 마셨다.
오리는 2인분에 한 마리로 조리되고 원육을 통째로 들고 와 해체부터 조리까지 한 시간가량 게리동 서비스를 진행한다. 오리 뼈를 일일이 끊어내던데 그보다도 극한 직업이 또 없다.
부위별 해체가 끝나고 나선 다리와 날개, 허벅지 등은 주방으로 들어갔고 몸통과 가슴살 같아 보이는 부위만 남았다. 그리고 잡뼈들은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압착기 안에 들어갔다.
주스라고도 하는 육즙을 압착기에서 뽑아내기 위해서인데 사실상 핏물을 쫙 뽑는 것과 다름없었다.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으로 이 레스토랑이 몇백 년 전에 최초로 개발했다 한다.
이렇게 힘들게 뽑아낸 오리 주스는 앞서 분해한 몸통과 가슴살을 먼저 불판에 굽고 건진 뒤 소스로 재탄생했다. 피노누아 와인과 소량의 위스키를 첨가하여 불판에 끓고 졸여졌다.
주스가 완전히 소스로 거듭났을 땐 불을 약하게 줄이곤 몸통과 가슴살을 불판에 다시 올려 버무려가며 졸였다. 그렇게 몸통과 가슴살 그리고 주스로 만든 오리 요리가 완성됐다.
오리 요리가 코앞으로 서빙되기 전엔 간단한 애피타이저가 먼저 제공됐다. 방울토마토와 바삭한 칩 그리고 곡물 가루를 곁들인 무스였는데 왠지 오리 간 무스인 듯 달고 녹진했다.
이어서 준비된 오리 요리는 약간의 가니쉬와 접시에 예쁘게 플레이팅 되어 나왔고 얼핏 봐선 스테이크 같았다. 그런데 소스에서 올라오는 주스 냄새로 딱 아닌 걸 알아차릴 수 있다.
오리고기를 한 입 크기로 잘라 소스를 듬뿍 입혀 먹어봤으며 무척 진하고 강렬한 소스가 확 와닿았다. 텁텁한 농도에 맛은 초콜릿이 떠오를 만큼 고소했는데 하나도 비리지 않았다.
오히려 풍미가 깊어 먹을수록 중독되었고 조금도 부담될만한 맛이나 요소가 없었다. 오리고기는 미디엄 레어로 익어 꽉 찬 육즙과 거기서 터져 나오는 살캉한 식감이 예술이었다.
당연하게도 72유로짜리 오리 요리는 이 한 접시로 끝날 리 없다. 게리동 과정에서 주방에 가져간 오리 다리와 날개, 허벅지로 만든 요리가 하나 남았으며 그에 앞서 셔벗을 내줬다.
이건 또 그냥 셔벗이 아니라 도수가 무려 40도인 옹플뢰르의 사과 증류주, 칼바도스를 부어주는 셔벗이어서 한입 먹곤 몸에 열이 확 올랐다. 반대로 입안은 차갑게 확 클렌징됐다.
두 번째 오리 요리는 오리 튀김으로 까끌까끌거리는 튀김옷이 뼈에까지도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흥미롭게도 닭똥집도 튀겨놔 맛봤더니 아주 별미였고 가니쉬론 샐러드가 담겼었다.
큼지막한 튀김을 하나 집어 반으로 갈라봤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속 익힘이 완벽한 미디엄이었다. 튀김처럼 바삭한 크러스트를 입힌 오리 스테이크 아닌가 싶었으며 맛도 그러했다.
첫 오리 요리에 비해 오리의 육질이 더 단단하면서 쫄깃하단 차이가 느껴졌고 튀김옷의 크런치한 식감이 더해져 색달랐다. 너무 맛있었고 여기까지 먹으니 포만감이 극에 달했다.
그리하여 아쉽지만 디저트는 패스했으며 그럼에도 거의 세 시간을 먹고 나왔다. 여러모로 강렬한 기억이 남는 저녁식사였던 데다 이번 여행 최고 식대와 만족도를 모두 기록했다.
Service war sehr nett, aber es ging etwas schleppend voran.
Ambiente gewöhnungsbedürftig… sieht alles etwas renovierungsbedürftig aus (Teppichboden) und die Promis sind nun wirklich in die Jahre gekommen. Im oberen Stockwerk leider nur uraltes Klimagerät, das für den Raum nicht ausreichend ist.
We went there for an evening meal, and what a disappointment it was. Spent over £250 for three people, and it turned out to be one of the worst dining experiences we've had.
The fish was overcooked, and the starter was just about passable. My lemon cake dessert was a disaster the cake was bone dry, like it had been left out for days, and there was barely any cream. The soufflé was average at best. The cheese course had a decent selection, but the staff were completely uninterested, they only gave the names of the cheeses and offered no explanation or engagement.
The atmosphere didn’t help either. The interior is cluttered with old, tacky photos of celebrities from decades ago, which just adds to the dated and dreary vibe.